이해는 가외다. 존중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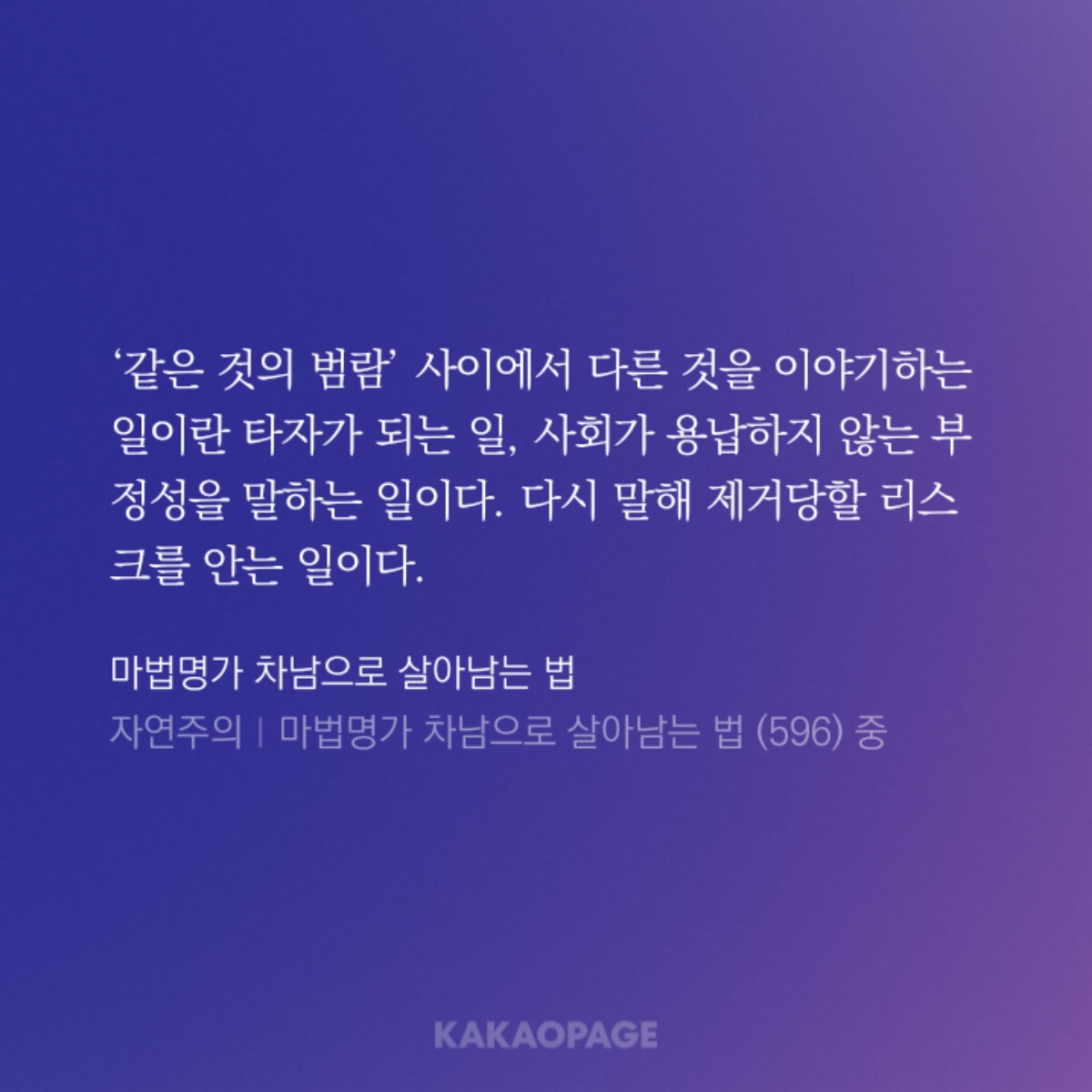
최근 몇 년간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느껴 온 피로가 떠올랐다. 이게 다 일론 머스크 때문인지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근래에 더 불거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문제 제기가 ‘공론화’의 형태로 등장하고 문제로 지목된 사람에게 우르르 달려가 응징하는 요즘 방식에 나는 꽤 두려움을 느낀다.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어도 이런 예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2차 캐릭터에 대한 정치적 해석, 성 도착증, 트랜스젠더, 아무튼 대중이 믿는 정상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저 언급만 해도 사회에서 제거당할 리스크를 안는다. 성 노동자의 인권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장미 우산 이모지를 트위터 닉네임에 달아두면 그걸 달아뒀다는 사실만으로 갖은 공격을 받는 시대다.

그래서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었다고 생각했다. 이해와 공감이 상투어가 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제일가는 가치로 여겨지는 오늘날, 작가는 말한다. 이해는 가외다. 존중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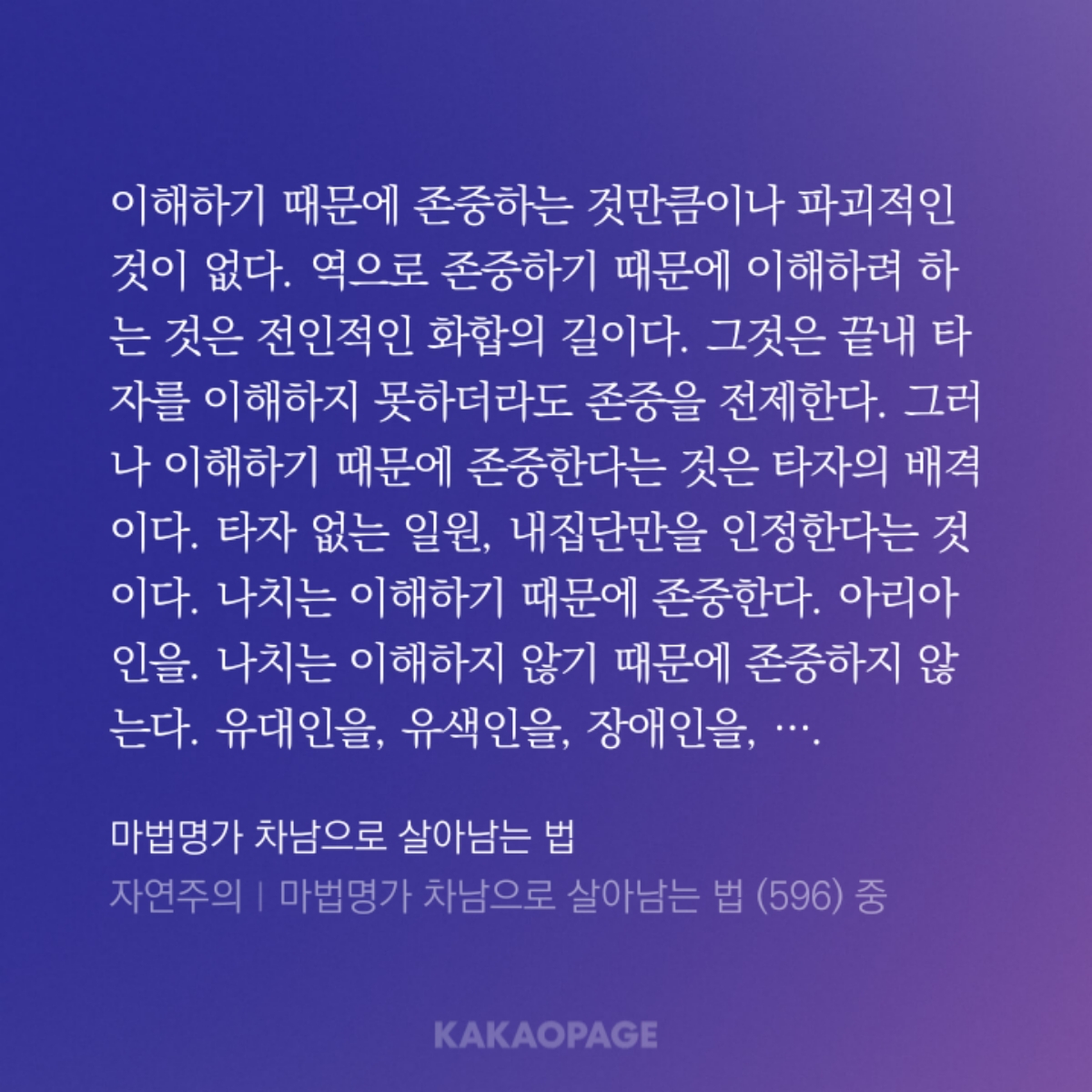
“이해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파괴적인 것이 없다.” 트랜스젠더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분들이 질리도록 듣는 말 - 나는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 - 에 대해, 걸어다니는 성소수자 사전처럼 친절하게 개념을 설명해 줄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다는 생각이 든다. 설명하면 정말 이해할 수 있나? 당신의 ‘이해’가 그토록 폭이 넓나? 그리고 당신과 나의 이해 따위가 뭐라고 생면부지 타인의 존재를 결정짓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모두 사회 변두리로 몰아낼 수 있다면, 도대체 이게 나치와 다를 게 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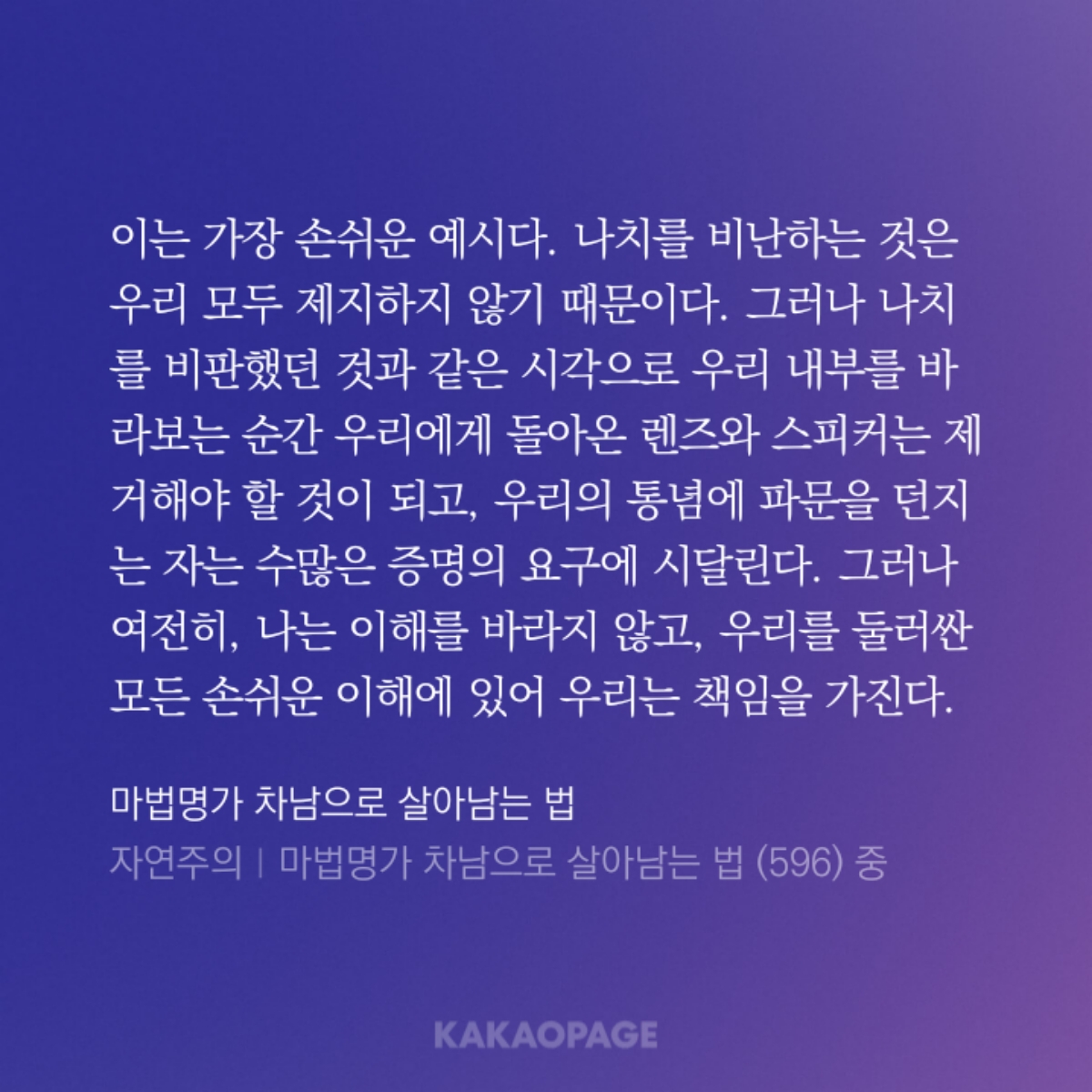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마지막에 강조하는 포인트 하나는, 거리낌 없이 비난할 수 있는 먼 대상을 보지 말고 같은 시각으로 우리의 내부를 보라는 것이다.
당신들이 도대체 나치와 다를 게 뭔가 하고 당당하게 말할 때 실은 그 비슷한 면모가 내 안에도 존재한다. 내가 편안하게 여기던 공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이 공간에 존재할 권리가 있을 때 -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는 그 사람만이 알 것이다. 나는 수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배운 사람일 뿐 실제로 실천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 남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게 쉽지 못된 나를 인정하고 바꾸기란 솔직히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작가의 말마따나 우리는 모든 손쉬운 이해에 있어 책임을 가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