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복과 그 바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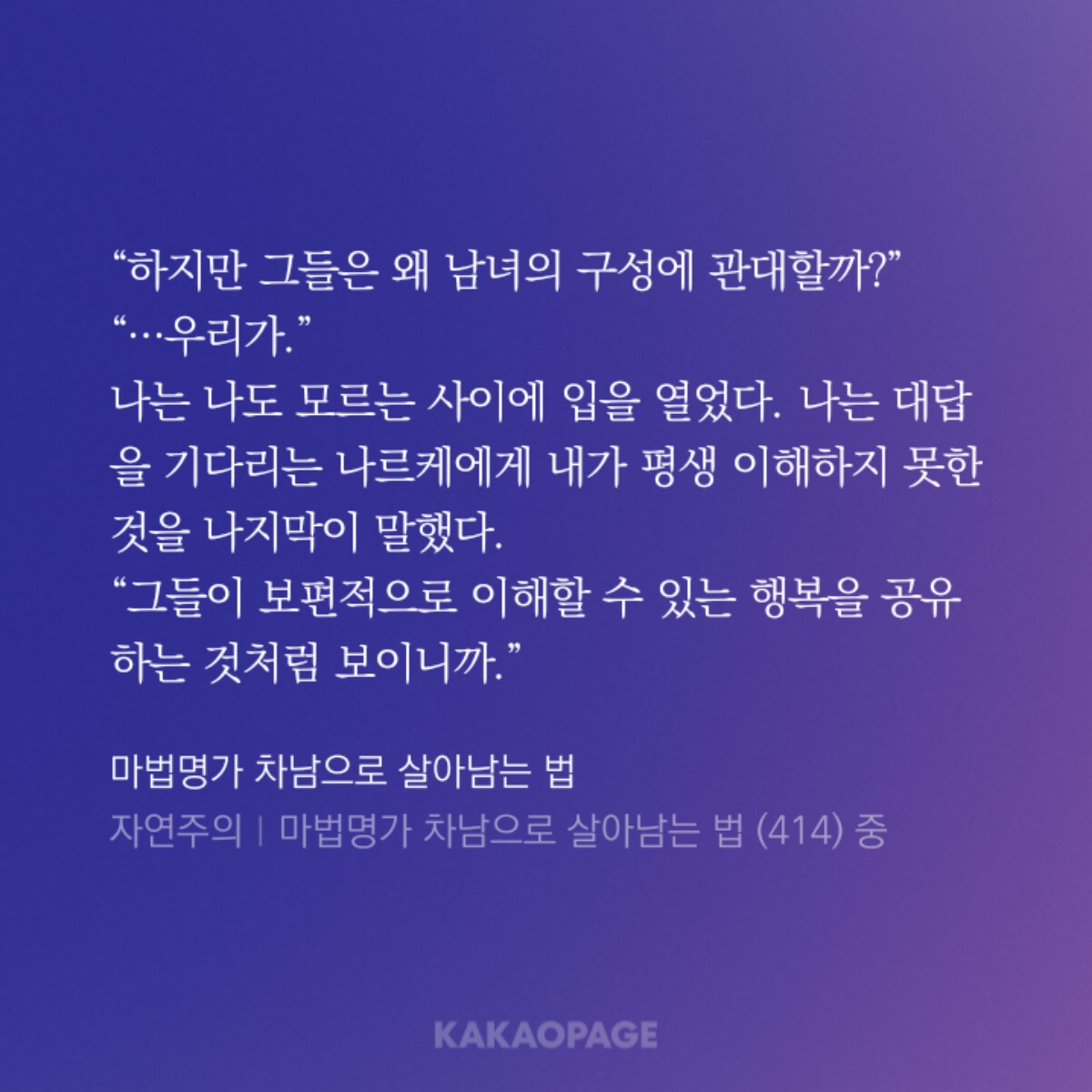
또 한 템포 숨을 들이쉬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었던 문장.
정보를 얻기 위해 낯선 곳에 잠입했다가 들킬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맨스를 연기해서 빠져나가는 전개는 클리셰라고 부르기도 애매하다. 수많은 탐정물과 첩보물에 그런 장면이 있었고, 특히 여성 캐릭터들의 생존 능력과 기지를 보여줄 때 많이 사용되어 왔다. 사람들은 남녀로 구성된 한 쌍을 기이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여긴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도 그들이 남녀 한 쌍인 걸 확인하는 순간 아. 커플. 하고 내 안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진다. 내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뭔가를 안다고 착각한다. 정작 그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복”을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도, 사람은 누구나 그 행복을 잘 알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인식이 너무 지배적인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 인식을 답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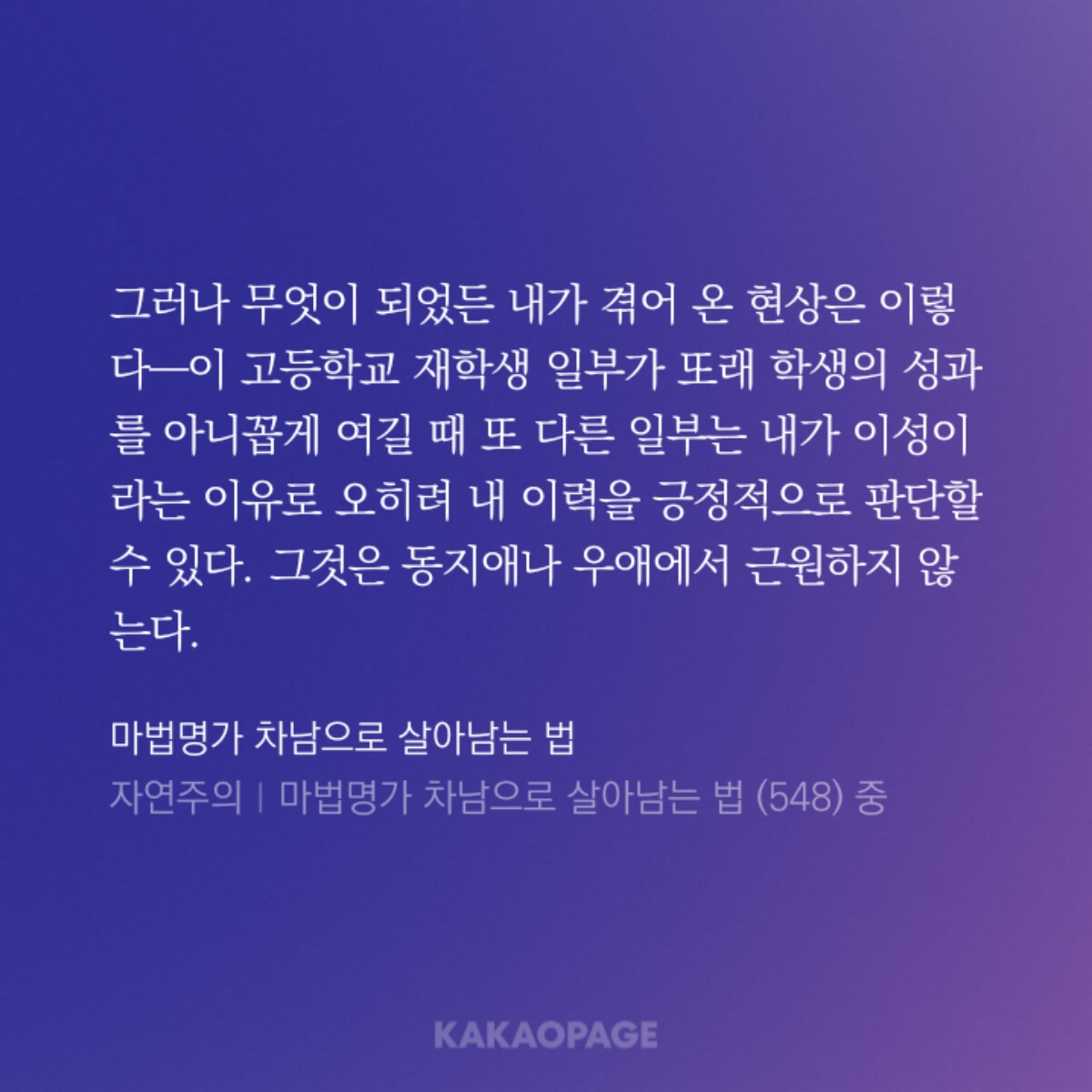
주인공은 특히나 그 차이를 섬세하게 느낀다. 자신을 향하는 애정의 결이 정확히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누군가는 주인공의 성과를 아니꼽게 여길 때 누군가는 주인공의 행보를 매력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후자는 동지애나 우애에서 근원하지 않으므로 두 감정은 상쇄되지 않는다. 주인공은 그런 감정을 매번 생경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소화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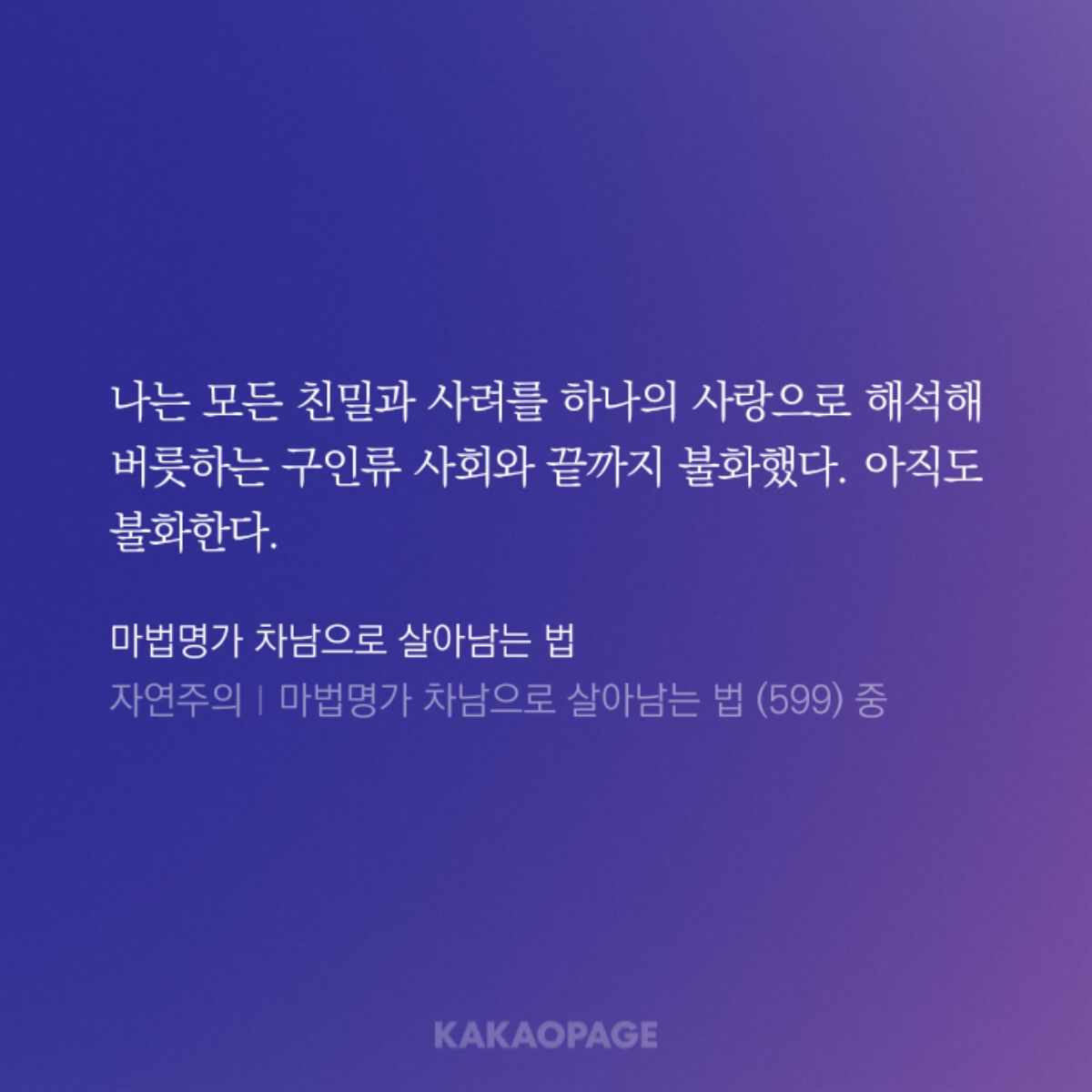
퀴어 용어로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주인공은 확고한 에이로맨틱으로 보인다. 로맨스 감정을 평생 이해할 수 없었고 일종의 사회 규약으로 받아들인 채 줄곧 연기해 왔음을 여러 번 고백하는데다, 주인공이 타인에게 갖는 ‘친밀과 사려’가 오독되었을 때의 거부반응도 소설 내에서 아주 크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모든 친밀과 사려를 하나의 사랑으로 해석해 버릇하는 구인류 사회’는 나도 모른 척하고 지낸지 오래 됐는데, 눈 감고 흘려보내고 있을 뿐 여전히 나를 둘러싼 건 그 사회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그 요철은 참 메워지질 않는다. 무섭도록 날아드는 결혼식 청첩장을 볼 때도 느끼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는 - 우정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되지 않으나 로맨스는 결코 섞여 있지 않은 - 친애의 감정을 표현할 언어가 아직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