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이 아니기를 선택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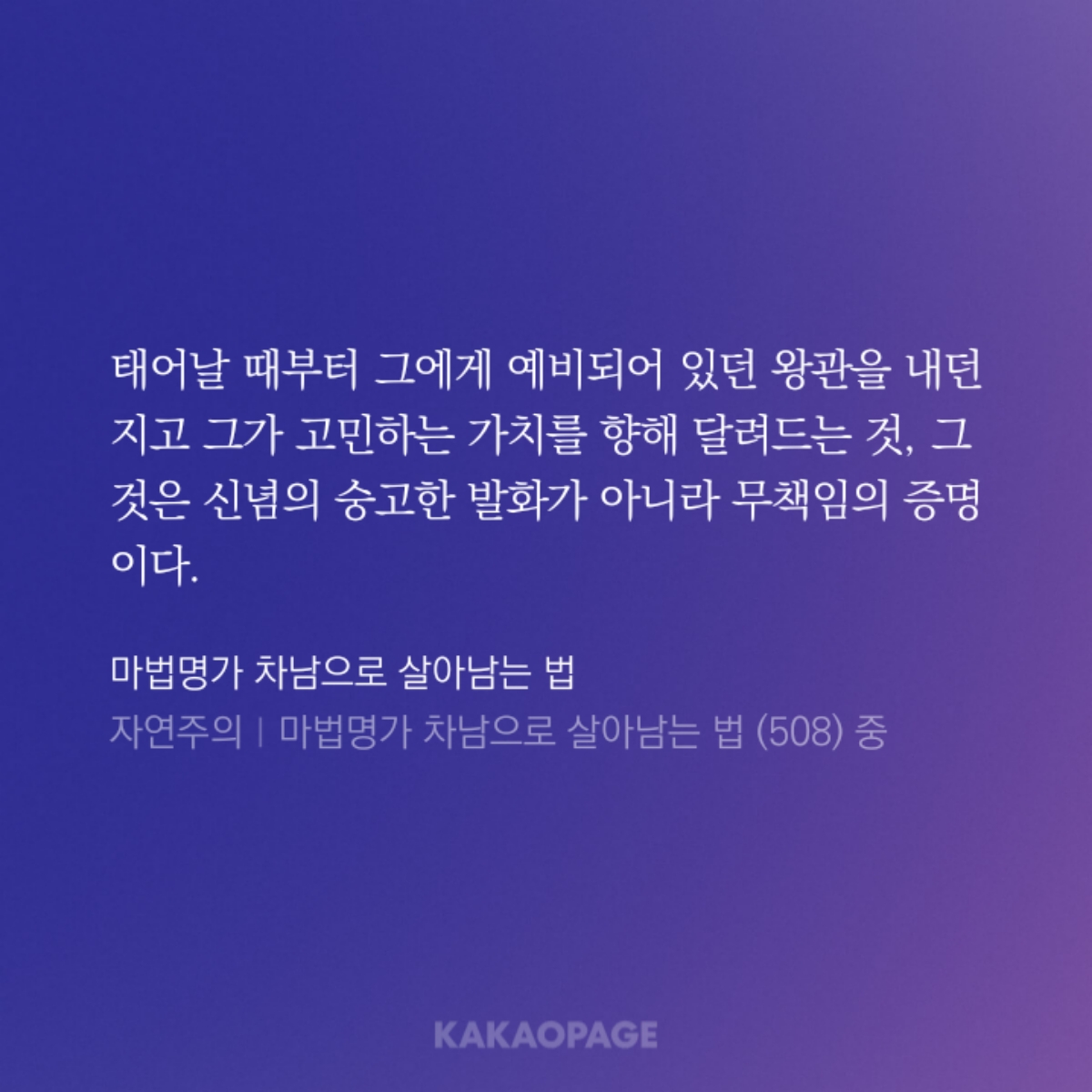
『마차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장르가 내 장르가 됐음을(ㅋㅋ) 인정하게 됐던 단락.
배경 지식은 다 집어치우고, 아무튼 여기도 통치 가문의 자식이 등장한다. 왕관을 물려받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으나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개념 자체에 썩 동의하지 않는 왕자. 『문송안함』의 아서도 그런 인물이었고. 맨날 왕가 재산 탕진하며 놀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술집에서 일대일로 말 걸어보면 의외로 세상의 변화를 꿰고 있는 3왕자 캐릭터는 이제 클리셰나 다름없게 느껴지지만, 그런 왕자가 어째서 종국엔 왕위에 올라야만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당위로 풀어내려 했던 건 『마차살』 특유의 고집이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이 단락에서 어떤 위안을 받았다. 신념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요즘 정말 많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해 ‘나’의 생각을 쏟아내고 생각이 다른 남과 싸우고 때로는 신념의 이름으로 혐오를 한다. 신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반면 내가 가진 책임, 누가 뭐래도 지키고 싶은 것들을 수호하는 발화는 요즘 시대에 인기가 없다. 그래서 작가님의 이 단호한 확언이 깊게 와닿았다. “그것은 신념의 숭고한 발화가 아니라 무책임의 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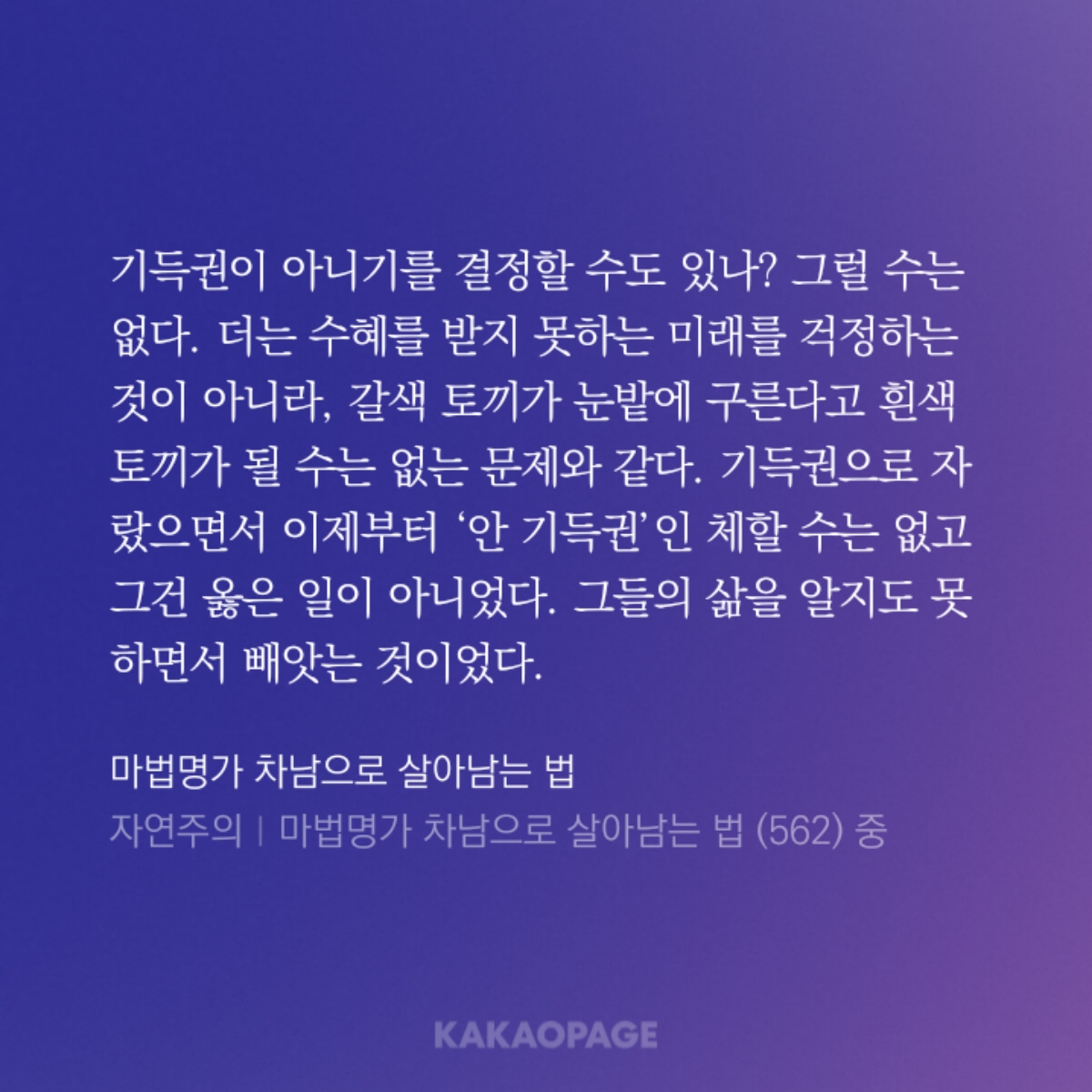
“갖고 태어난 특권이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엘리트주의로 들릴 수 있어서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정돈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잘 가닿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 특권이 없는 삶은 여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다. 연대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알아서 연대하나? 내가 성노동자의 삶을 아나? 트랜스젠더는? 가난한 사람은? 설령 내가 삶의 어느 순간에 가난을 겪게 된다 한들, 이 가난이 그 가난과 같나?
트위터에서 RT 좋아요 몇 번 했다고 그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진 않는다. 적어도 현재의 나는 기득권의 위치에 있고, 기득권이 아니기를 결정할 수도 없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쪽이 아마 내가 덜 무례해지는 길일 거라고 요즘 종종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