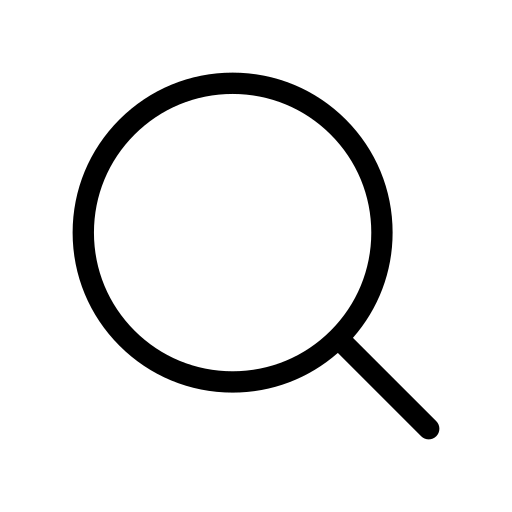유럽여행 12일차 - 리스본 마지막날
0. 아침

Manifest Lisbon.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틀 연속 큰 깨달음을 얻고 이날은 아침 9시부터 파스타를 해치웠다. 엄청 큰 새우가 다섯 마리나 들어 있었다. 별로 검색 안 하고 찾아왔는데 아주 흡족하고 배부른 식사를 했다.
1. 파스테이스 드 벨렝


별 기대가 없더라도 여기까지 왔다면 가보지 않을 수 없는 리스본의 에그 타르트 맛집 벨렝. 바로 옆에 제로니무스 수도원도 있기 때문에 버스 안은 관광객으로 바글바글했다. 이미 숨 쉴 공간도 없이 사람이 꽉 들어찼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난 들어가야겠어 하며 (물론 십분 이해합니다)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어느 시점부턴 캐리어 올려두는 짐칸에 쪼그려앉아서 갔다. 그래도 의자에 앉은 사람 다음으론 내가 쾌적하게 갔을 듯.
그리고 에그 타르트에 대한 나의 감상 : 여기에 무슨 특별한 맛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슈크림 붕어빵을 안 먹어본 게 분명하다.

날씨가 끝내줬다. 이 날씨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즐기며 먹으면 에그 타르트 아니라 뭔들 안 맛있을까 싶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공기를 타고 행복이 스미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럴 수 있으면서 왜 첫날엔⋯ 억울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화들짝 놀라 나를 다잡았다. 지금 날씨에 감사하자. 여기서 짜잔 하고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면 나 진짜 외국 한복판에서 운다.


에그 타르트 6개가 든 번들을 한손에 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날씨 좋은 리스본을 만끽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제로니무스 수도원 앞의 제국광장, 바다에 인접한 코메르시우 광장, 그리고 아우구스타 개선문. 제국광장 바로 옆에는 거리 전체에 플리마켓 같은 장이 서서 관광 기념품부터 수공예품, 중고책(!)까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구경은 열심히 했지만 딱히 구매는 하지 않았다.
2. 점심


Lisboa Tu e Eu 2. 역시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은 맛집. 원래 이곳의 가장 인기 메뉴는 문어 요리라고 들었지만 문어는 어제 먹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번도 먹지 못한 바칼레우 요리를 시켰다. 바칼레우는 포르투갈의 국민 음식 중 하나로 소금에 절여 말린 대구를 뜻하는데 바칼레우를 넣고 만든 볶음밥은 Bacalhau à Brás, 크림을 넣고 리조토처럼 만든 건 Bacalhau com Natas, 크로켓처럼 만든 건 Pastéis de Bacalhau 라고 부르는 등 변주도 무척 다양하다. 식당마다 바칼레우 맛도 다 다르다고 하니 우리나라로 치면 식당에 갔을 때 김치가 맛있는 곳이 진짜 맛있는 곳이라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다.
바칼레우는 생각보다 짰지만 물을 더 들이켜서라도 끝까지 먹고 싶을 만큼 맛있었다. 그리고 이날은 운이 좋게도 옆자리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옆자리엔 남자 손님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내가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지 내게 구글 번역 앱의 사진 번역 기능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나는 번역 기능을 몰라서 메뉴판을 오래 본 게 아니라 뭐 먹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느라 오래 본 거였지만 민망해서 아 그렇구나..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자 옆자리 남자는 여기 샹그리아가 꽤 맛있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오. 그건 좀 유용한 정보. 그래서 샹그리아를 같이 시켰다.
다른 여행객과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긴 대화였다. 옆자리 남자는 미국에서 왔다고 했다. 가족 여행을 와서 유럽을 3주 정도 돌았는데 가족들은 먼저 돌아갔고 리스본은 자기 혼자 왔다고. 며칠 더 있다 귀국할 거래서 서로 리스본에서 어디 다녀왔는지 정보 교환도 했다. 추천하는 곳 있냐길래 민주화 박물관을 추천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상한 거 추천하는 사람으로 보였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참고로 샹그리아는 진짜 맛있었기 때문에 한 잔 더 마셨다.


점심 먹고 뭐했더라? 그냥 돌아다니면서 동네 구경하고 전자책을 좀 읽었던 거 같다.
3. 일몰 구경



Jardim do Torel. 여행 마지막 날인만큼 일몰을 보고 싶어 리스본에서 일몰 보기 좋은 곳을 검색해 찾아갔다. 그런데 몇 가지 맹점이 있었으니 1. 가는 길이 이렇게 가파르다고는 지도가 알려주지 않았다 2. 이곳은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주로 찾는 공원이었다. 내가 갔을 땐 돗자리 깔고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중고등학생 무리와 벤치에 앉아 혼자 에어팟 끼고 스마트폰 보는 동네 청년과 여기 좀 낯설지만 그래도 난 사진을 찍겠어! 정신으로 무장한 극소수의 관광객이 있었다. 뭔가 기묘했다. 공원은 작고 평범했고 일몰도 특출나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어쩐지 여행 끄트머리에 처음으로 현지인의 리스본을 만난 거 같았다.
그리고 여행기를 쓰는 지금, 저 공원이 뉴진스의 뮤비 촬영 장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럴 수가.
4. 저녁

El-Rei Dom Frango.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저녁에 간 식당은 맛이 없었다. 일단 아침에 간 식당의 파스타가 더 맛있었고, 내 기준에선 여기 파스타 면이 약간 덜 삶겨 나왔다. 셰프 아저씨는 파스타 면을 8분만 삶는 걸까? 난 10분은 삶아야 한다고 생각해.. 후기를 찾아보면 나만 운이 안 좋았고 모두가 최고의 식사를 한 거 같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샹그리아조차 점심에 갔던 식당이 더 맛있었다. 음.
5. 독서 기록
심지어 그날은 매우 상징적인 날이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아 함께 기뻐하며 교회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다. 리스본의 주민 27만 5,000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지진이 강타했다. 10분 동안 지축이 흔들렸다. 교회 촛대의 많은 초들이 쓰러지고 도시 곳곳에 불이 났다. 가옥의 3분의 2가 무너지거나 불탔다.
리스본의 대참사를 최소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세상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 스스로를 <볼테르>라고 불렀던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1694~1778)가 그 주인공이다.
마침 읽고 있던 책에서도 리스본 언급이 나왔다. 1755년에 발생했던 리스본 대지진. 사상자 수와 물적 피해만으로도 심각했지만 무엇보다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아 신자들이 모두 예배를 올리고 있던 날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회의, 자연 재난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계몽주의가 유럽 전역에 들불처럼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볼테르다. 다음은 볼테르의 어록 중 하나다. ‘자연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우리가 질문해 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도다. 우리에겐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신이 필요하다.’
근데 볼테르가 진짜 이름이 아닌 건 이 책에서 처음 알았다. 필명이었구나.
프랑스 사회에서 꽤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프로이센 왕세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었다. 외국 군주와 호의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다가는 자칫 위험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프리드리히가 노려야 할 사람은 똑똑하고 달변인데다가 이름은 꽤 났지만 그와 동시에 프랑스 궁정으로부터 몹시 시달리는 아웃사이더여야 했다. 거기다 프로이센 왕세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닐 만큼 공명심이 큰 사람이라면 더더욱 좋았다.
사실 왕과 볼테르는 대부분의 삶 동안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부딪칠 때마다 뼈아픈 패배를 맛본 쪽은 거의 항상 철학자였다. 이 계몽주의자는 앙심과 시기심에서 프리드리히의 은총을 즐기는 모든 경쟁자들을 헐뜯고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다. 특히 왕의 총애를 받던 철학자 크리스티안 볼프가 그 대상이었다.
좀.. 웃긴 사람이라는 것도 이 책에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투명하게 야망이 넘치다니 누가 K드라마 주인공으로 좀 만들어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