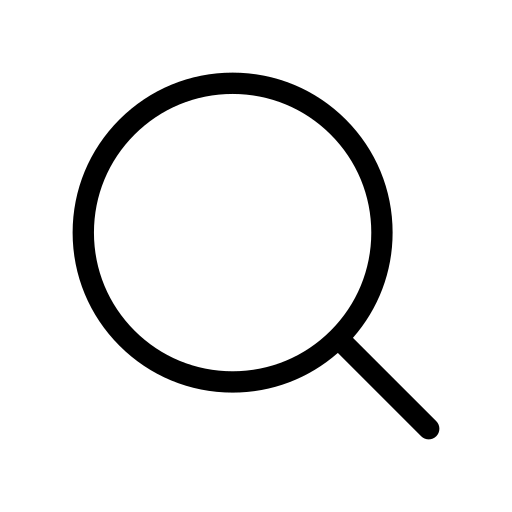유럽여행 7일차 - 뮌헨 둘쨋날 (오후)
0. 성 피터 교회 전망대

이게 그러니까, 소설에도 묘사가 있기는 했다. “다리는 아프지만”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뮌헨 전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근데 다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프다는 건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전투를 하는 친구들인데 다리 아프다는 언급이 왜 나왔는지는 미처 생각을 안해봤을 뿐이지. 성 피터 교회 전망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오로지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 각도를 보면 절로 입에서 엘리 이 미친 것 제정신 아니지 소리가 흘러나온다. 사진으로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계단이 꽤 가파르다. 엘리아스가 좋아하는 성 피터 교회 전망대로 가는 길이란,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갈 수 있는 너비의 나무 계단을 내내 이 각도로 15층까지 올라야 한다는 뜻이다. 폭이 어찌나 좁은지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계단에서 마주치면 모두 제자리에 서서 적극적으로 교통 정리에 임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아무도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다.

혼자 온 사람이든 여럿이 온 사람이든 급격히 말수가 줄어드는 15층의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갑자기 철제 울타리 하나만 덜렁 주고 사람을 15층 난간 나무 바닥으로 몰아세우는 잔인한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소리가 잘 들어갔나 모르겠다. 전망대에서 보는 뮌헨 전경? 당연히 아름답다. 아름다운데지금그게문제가아니고 여기 담력 체험으로 마케팅해도 될 만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분다. 너무 무섭다. 사람들 다 난간 잡고 움직인다. 고소공포증 그런 거 없고 무서운 놀이기구도 잘 타는 편인데 여긴 정말로 사진 찍다가 바람 때문에 핸드폰을 놓쳐서 핸드폰이 철제 울타리 사이로 멀리멀리 날아가버리면 이제 제 남은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순수한 공포심이 압도한다. 두 손과 두 발은 모두 내 목숨을 안전하게 보존하는데 써야지 여기서 사진을 찍겠다는 건 너무 욕심 같이 느껴진다. 어떻게 여기를 뢰벤브로이에 호프브로이를 한 잔씩 때리고 올라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엘리 이 미친 것 제정신이 아냐..


그래도 어떻게든 찍어온 두 장의 사진.

내려오는 길에 뽑은 성 피터 교회 기념 메달. 전망대 계단 시작점과 출구 쪽에 각각 한 대씩 자판기가 있어서 1유로인가 2유로인가 돈을 넣으면 원하는 문양으로 뽑을 수 있다. 사실 내려오는 길이 더 무서웠다. 경사가 워낙 가팔라서 와 이거 잘못 삐끗하면 독일 여행 막판에 깁스 가능~~ 그건 별로 엘리 안 따라해도 되는데~~ 하면서 조심조심 손잡이를 꼭 잡고 내려왔다. 그리고 헉헉대며 올라가는 또다른 사람들을 중간에서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응원의 말을 건네게 된다. keep going! It works! 나도 그런 응원을 받으며 올라왔고 이게 사실 등산길이나 다름없어서 으쌰으쌰가 좀 필요하더라. 심지어 정말 오랜만에 한국인 관광객을, 그것도 가족 단위로 만나서 정겹게 화이팅! 도 외치고 지나갔다.
0-1.


Geschenke Kaiser am Rindermarkt. 성 피터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기념품 가게. 바이에른 굿즈라는 건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바이에른의 사자 문양이나 비텔스바흐의 흰색/하늘색 마름모 무늬를 곁들인 굿즈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근데 빈티지 뱃지가 꽤 비싸다. 17번 뱃지가 탐나서 가격을 봤는데 25유로, 한화로 환산하면 4만원이 넘는다. 왜요??? 뉘른베르크 수공예 장인이 만들기라도 했대요???
컵 기념품을 살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이 여행기를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릴 때 트친 분이 ‘컵 사서 엘릭서 만들어요!’ 라고 하셔서 거기에 넘어갔다. 『마차살』에서 비텔스바흐 가문이 엘릭서 만들기에 특화된 곳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유리잔은 보관이 번거로울 거 같아서 패스하고 바이에른의 사자 문양이 장식처럼 올라간 소주잔 크기의 스테인리스 잔 하나를 샀다. 여기다 박카스 담아마시면 이제 나도 비텔스바흐 엘릭서 마신 거야.
1. 독일식 도넛

Schmalznudel - Cafe Frischhut. 독일식 도넛이라는 걸 먹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뭐야뭐야? 하고 같이 줄을 선 곳이었다. 구글 맵 리뷰에는 독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메뉴라는 말이 있던데 오히려 그걸 보고 신뢰가 갔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틀린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어. 그들의 맛이 진짜 맛이야. 마침 자리가 났길래 카푸치노와 함께 주문했고, 도넛은 미리 만들어 둔 걸 내주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은 다음에 굽기 시작하시는지 조금 앉아서 기다리니 따끈따끈 갓 구운 것으로 나왔다. 갓 구운 빵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있는 게 설탕 뿌리면 꽈배기와 비슷한 느낌일 거 같았다. 비록 계산은 현금밖에 받지 않고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날 때까지도 복작복작 줄이 길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빵과 괜찮은 커피로 점심 시간을 보내서 이날 약간 눈물 나게 행복했다. 역시 독일은 자신들의 강점을 잘 모르는 게 틀림없어. 이런 건 밥이 아니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2. 님펜부르크 궁전 (1)

오늘 오후의 방문지는 비텔스바흐 가문의 여름 별궁이라는 님펜부르크 궁전. 뮌헨 시가지에서 거리가 조금 있어 버스를 30분 정도 타야 한다.

그리고 여행을 P로 다니면 곤란한 이유 : 10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겨울 시즌으로 치기 때문에 내부 투어 티켓을 세 시 반까지만 판매한다는 사실을 당일 세 시 사십사분에 알게 됨.


외부 구경은 원없이 했다. 이날 보지 못한 건 궁전 내부와 박물관 뿐인데, 뮌헨까지 와서 관광 컨텐츠를 다 즐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건 너무 억울하므로 다음날 일정을 쪼개서 다시 오기로 했다. 원래 다음날은 좀 설렁설렁 다닐 예정이었으나 여기서 스텝이 꼬이는 바람에 여행 일정 중 가장 바쁘게 돌아다니는 날이 됐다.
정원과 호수만 한껏 눈에 담고 다시 뮌헨 시가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 도넛을 포장해서 나왔더라면 제 시간에 올 수도 있었겠다고. 하지만 만약 한 시간 전으로 돌아가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때의 나는 님펜부르크 따위 멀리 던져버리고 도넛은 두 개 커피는 한 잔 더 마시는 선택을 했을 테고 심지어 버스에 타고 있는 나도 그게 훨씬 현명했다는 생각이 드니 아무튼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단 결론이 난 것이다⋯.
일몰


겨울로 가는 길목이라 해가 정말 빨리 진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다섯 시면 문을 닫고 다섯 시 반이면 슬슬 일몰이 시작된다. 문득 여행을 일주일이나 다녔는데 일몰 시간에 맞춰 전망 좋은 곳에 오를 생각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가, 여행을 일주일이나 다녔지만 저녁에 비가 오지 않은 게 오늘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진정했다.
뢰벤브로이


오늘의 저녁은 뢰벤브로이. 호프브로이와 뢰벤브로이 중 어느 쪽이 더 맛있는지 매번 결론이 바뀐다는 엘리아스를 따라 나도 대결의 끝을 맺으러 뢰벤브로이하우스에 왔다. 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해 있던 호프브로이와 달리 여기가 어디지? 싶은 곳에 약간 떨어져 있고 건물의 모양새가 굉장하다. 왜 이렇게 입장하는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형태로 지었는지 모르겠다. 으리으리 번쩍번쩍⋯. 한국에서 이런 건물을 봤다면 가짜 유럽 흉내라고 배를 잡고 웃었을 텐데 진짜 유럽에 이런 게 있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호프브로이처럼 혼이 나갈 만큼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합석은 필수였다.


역시 전날의 법칙을 이어받아 수프를 같이 시켰다. 메뉴 이름은 Leberknödelsuppe. 직역하자면 간(leber)으로 만든 독일식 만두(knödel)가 들어간 수프(suppe)다. 크뇌델은 독일 남부 요리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서 자우어크라우트가 독일의 김치와 단무지라면 크뇌델은 돈가스 시켰을 때 옆에 기본으로 한 스쿱 떠 주는 밥 같은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게 없다고 돈가스가 돈가스 자격을 잃진 않지만 말도 없이 안 주면 좀 그렇긴 하다. kartoffelknödel, 영어 메뉴판에서 potato dumpling 으로 번역되는 친구는 이제 실컷 먹어봤으니 다른 걸 먹어보자 싶어서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럭저럭 괜찮았다. 근데 부속고기를 넣고 끓인 따뜻한 국물을 내주면 한국인은 보통 맑은 술을 찾게 된다는 게 좀 맹점이다. 이게 굉장히.. 맑은 소고기국과 맑은 내장탕 사이 어딘가에 외국 향신료를 듬뿍 친 맛이 난다. 혼란스러운데 맛있고 근데 혹시 소주는 없냐고 묻고 싶어지는 그런 맛.
맥주 후기 : 내가 맥주 맛을 그닥 섬세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실감했다.

왜 꼭 한 입을 먹고서야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까? 사진이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munich style 이라고 써 있길래 궁금해서 시킨 메뉴인데 독일 여행 다니면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짰다. 씹으면 씹을수록 소금이 배어나오는 것 같은 짠맛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일본 음식 너무 짜다고 못 먹겠다고 할 때도 전혀 못 느끼고 맛있게 먹을 만큼 짠맛에 둔한데 이건 정말 차원이 달랐다. 배가 고픈데, 진짜로 이걸 먹고 싶은데 소시지 한 입에 맥주를 100ml는 들이켜야 짠맛이 중화돼서 말도 못하게 억울했다. 도대체 『마차살』의 독일 신인류들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독일 사람들은 이런 걸 주식으로 먹는 걸까? 관광객인 나를 놀리기 위해 단체로 트루먼 쇼를 하는 게 아니고?? ㅜㅜ
뢰벤브로이는 두 잔 마셨다. 맥주가 맛있어서 두 잔을 마셨느냐? 그걸 느낄 겨를도 없이 소시지의 짠맛 때문에 두 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여행을 다닌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다. 여행 떠나기 전엔 유럽을 혼자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매일 밤잠 설쳤던 걸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극장 광고를 봤는데, 극장이 너무 아름다워보여서 약간 혹했다. 다음에 뮌헨에 또 올 일이 있다면 그땐 꼭 저기서 공연을 봐야지.
오늘 일정 끝!